 솔직이⇒솔직히, 가만이⇒가만히
솔직이⇒솔직히, 가만이⇒가만히 (1) 깨끗히(×)/깨끗이(0), 번번히(×)/번번이(0) (2) 극이(×)/극히(0), 엄격이(×)/엄격히(0) (3) 솔직이(×)/솔직히(0), 열심이(×)/열심히(0), 가만이(×)/가만히(0) 위와 같은 혼동은 접미사 ‘히’, ‘이’가 발음이 비슷해서 생긴다. 특히 (1)과 (3)이 더욱 혼동되는 경우다. 왜냐하면 (2)의 경우는 ‘-히’로 발음되는 것이 비교적 명확하지만 (1), (3)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1)의 경우는 ‘이’로만 나기 때문에 ‘깨끗이’로 적는다고 하지만 언중들이 일상 생활에서 그렇게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은 아니다. 아무튼 (3)은 ‘이, 히’ 모두 발음되는 것으로 ‘히’를 표준으로 삼은 것이다. (한글 맞춤법 제51항) 틈틈히⇒틈틈이, 꼼꼼..
솔직이⇒솔직히, 가만이⇒가만히
솔직이⇒솔직히, 가만이⇒가만히 (1) 깨끗히(×)/깨끗이(0), 번번히(×)/번번이(0) (2) 극이(×)/극히(0), 엄격이(×)/엄격히(0) (3) 솔직이(×)/솔직히(0), 열심이(×)/열심히(0), 가만이(×)/가만히(0) 위와 같은 혼동은 접미사 ‘히’, ‘이’가 발음이 비슷해서 생긴다. 특히 (1)과 (3)이 더욱 혼동되는 경우다. 왜냐하면 (2)의 경우는 ‘-히’로 발음되는 것이 비교적 명확하지만 (1), (3)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1)의 경우는 ‘이’로만 나기 때문에 ‘깨끗이’로 적는다고 하지만 언중들이 일상 생활에서 그렇게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은 아니다. 아무튼 (3)은 ‘이, 히’ 모두 발음되는 것으로 ‘히’를 표준으로 삼은 것이다. (한글 맞춤법 제51항) 틈틈히⇒틈틈이, 꼼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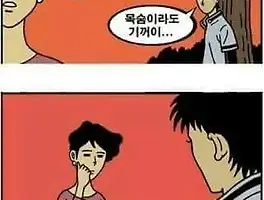 빈 간 ⇒빈 칸, 떨어먹다 ⇒ 털어먹다
빈 간 ⇒빈 칸, 떨어먹다 ⇒ 털어먹다 (1) 끄나불 ⇒ 끄나풀, 나발꽃 ⇒ 나팔꽃, 빈 간 ⇒ 빈 칸 (2) 동녁 ⇒ 동녘, 들녁 ⇒ 들녘, 새벽녁 ⇒ 새벽녘, 동틀녁 ⇒ 동틀녘(3) 간막이 ⇒ 칸막이, 빈 간 ⇒ 빈 칸, 방 한 간 ⇒ 방 한 칸 (4) 초가삼칸 ⇒ 초가삼간, 윗칸 ⇒ 윗간 거센소리를 표준으로 삼은 경우다. 이 규정은 언중들 사이에서 예사소리로 발음되던 낱말이 된소리나 거센소리로 바뀌는 일반적인 언어 현상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이를테면 '곶->꽃', '고->코'에서와 같이 '끄나불'이 '끄나풀'로 '간'이 '칸'으로 바뀌었음을 인정한 것이다. 다만 (4)의 경우는 '칸'이 아니라 '간'이다. (표준어 규정 제 3 항) 막히어 ⇒막혀 (1) 되었다 - 됬다(×) / 됐다(0) - 맞..
빈 간 ⇒빈 칸, 떨어먹다 ⇒ 털어먹다
빈 간 ⇒빈 칸, 떨어먹다 ⇒ 털어먹다 (1) 끄나불 ⇒ 끄나풀, 나발꽃 ⇒ 나팔꽃, 빈 간 ⇒ 빈 칸 (2) 동녁 ⇒ 동녘, 들녁 ⇒ 들녘, 새벽녁 ⇒ 새벽녘, 동틀녁 ⇒ 동틀녘(3) 간막이 ⇒ 칸막이, 빈 간 ⇒ 빈 칸, 방 한 간 ⇒ 방 한 칸 (4) 초가삼칸 ⇒ 초가삼간, 윗칸 ⇒ 윗간 거센소리를 표준으로 삼은 경우다. 이 규정은 언중들 사이에서 예사소리로 발음되던 낱말이 된소리나 거센소리로 바뀌는 일반적인 언어 현상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이를테면 '곶->꽃', '고->코'에서와 같이 '끄나불'이 '끄나풀'로 '간'이 '칸'으로 바뀌었음을 인정한 것이다. 다만 (4)의 경우는 '칸'이 아니라 '간'이다. (표준어 규정 제 3 항) 막히어 ⇒막혀 (1) 되었다 - 됬다(×) / 됐다(0) - 맞..